주거 양극화 현상 심화
거주 형태 따른 계급화
아파트 브랜드로도 차별

한국에서 거주지로 행해지는 차별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신(新)주택 계급사회’가 도래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다. 2015년 1월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 예비 소집 때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과 분양 아파트에 사는 학생을 분류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19대 국회에서는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학군에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뜻을 모으자는 글이 올라오거나, 아이가 임대아파트 학생과 짝꿍이 되자 학부모가 “짝꿍을 바꿔주지 않으면 전학을 가겠다”라고 학교에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주거 형태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빌라 거지’, ‘임대 거지’, ‘휴거(휴먼시아 거지)’, ‘주거(주공아파트 거지)’ 등 거주지 뒤에 거지라는 단어를 붙여 조롱하기도 한다. 주거지 형태와 크기가 빈부 서열을 나누는 척도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사회’에서는 차별이 일상화됐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디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라고 주의를 줄 정도다.
이런 인식 탓에 아파트 이름에서 임대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위례 사랑으로부영‘ 아파트는 이름에서 ‘부영’을 빼고 ‘위례더힐55’로 개명했다. 최근에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로 변경되었다. 부산 동구 범일동 ‘오션브릿지’와 대구 북구 ‘칠성아파트’는 원래 이름에서 임대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뺐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신도시에서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자가 여부 또한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계급이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로 구분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구분은 이뤄졌으나 점차 노골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준 또한 세분되고 있다. 주택의 소유 여부만을 따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의 몇 평형에 살고 있느냐를 따지는 식이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 같은 차별을 겪은 한 여성이 ‘아파트로 ‘사람 차별’ 하는 거 너무 우습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19만 6,000 조회 수와 1,133개의 추천 수, 300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초등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 작성자 A 씨는 “10~20억 차이가 나는 아파트도 아니고, 이것도 차별·무시하는 건 웃기긴 한데…”라며 “지방에서 1억도 차이 나지 않는 아파트끼리 ‘편 가르기’ 하며 무시하는 거 너무 웃기다. 최근 제가 사는 지역 주변에 그런 일이 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네티즌 A 씨는 “임대로 산다고 무시하고, 전세 산다고 무시하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무시하고. 장사한다고 무시하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무시하고, 국산 차 탄다고 무시하고”라면서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또한 ”단편적인 상황만 봐도 거지 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니…”라면서 “나 혼자 살 때는 귀 닫고 눈 감으면 남이 뭘 하든 무시할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 혼자일 때 느끼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참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서글프다”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차별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을 “가난한 사람과 분리해서 살고 싶어 하는 문화적 구별 짓기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며 “중산층이 사회에서 느낀 박탈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 강남 거주 같은 위계질서는 한국 사회에 여전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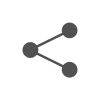

댓글1
위례더힐55와 포레스트부영은 다른아파트입니다. 이름이 바뀐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