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촌’ 근황
아파트 들어서는 교수촌
기자·문화예술인 살던 마을은?

과거 서울에는 사는 이들의 출신지나 직업 등으로 구분해 ‘~촌’이라 불리던 곳이 있었다.
직업으로 구분한 곳엔 기자들만 있어서, 교수들이 많이 거주해, 문화예술인이 모여들어서 각각 이름을 딴 기자촌, 교수촌, 문화촌 등이 있다.
이 별명이 붙은 곳의 위치는 어디이며, 현재 어느 모습을 하고 있을까?

2일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7-45일대로, 주변에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이 있다.
인근에 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명지대가 있고 국민대와 상명대도 멀지 않아 대학교수가 많이 살았다고 해 ‘교수촌’이라 불렸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이곳은 7개동, 최고 25층,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아파트가 세워진다.

‘기자촌’은 은평구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로, 기자들의 집단거주 구역이었다.
1960년대 당시 기자들 월급으로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기자를 위한 마을로 이촌동과 진관외동 터 두 곳을 제시했는데, 한국기자협회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택지도 넓은 진관외동을 택했다.
1969년 첫 입주를 시작, 1974년에 분양이 완료됐고, 입주 초기에는 420여 세대가 분양받았다. 당대 내로라하는 언론인들이 이곳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차 입주민이 감소, 1990년대 후반 퇴직 언론인들이 중심을 이루다가 2000년대가 돼 44가구 정도만 남게 됐다.
현재는 북한산 자락 아래 윗마을 일부만 빈 땅으로 남기고 ‘은평뉴타운’이 들어섰다.
뉴타운의 1~11단지 아파트의 이름들은 모두 진관동의 옛 지명들에서 유래되어 지어졌는데, 이 중 11단지가 기자촌아파트로 불린다.
총 10동, 426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11C㎡형이 7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문화촌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살았다.
1950년대 말, 홍제천 변 자갈밭을 정리해 반듯한 골목과 집터를 조성한 곳으로, 양옥집 30여 채에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했다. 당시 양옥집은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서구 스타일의 문화주택이라 소개됐다.
당연히 ‘문화촌’은 상품이 되었고, 아파트에는 ‘문화촌’과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녔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 이 일대는 지하 3층, 지상 20층짜리 문화촌 현대아파트로 바뀌었다. 총 4동, 768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09㎡형이 6억 9,9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이 밖에도 서울엔 다양한 ‘촌’이 존재했거나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용산구 용산동2가와 후암동 고지대 동네 일부 지역인 ‘해방촌’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신궁의 일부와 일본군 제20사단의 사격장이 있던 곳으로, 해방과 더불어 형성되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대표적인 부촌인 용산구 이촌동은 신흥 부자들이 많이 살아 도둑이나 강도가 많이 출몰한다고 해서 도둑촌이라 불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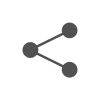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