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극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신세계, 파라마운트와 협업
한화, 인천 테마파크 조성 예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부터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까지 대한민국 유통 대기업 3세들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초대형 테마파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표방하는 글로벌 테마파크 ‘스타 베이 시티’ 조성에 나섰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 2029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 베이 시티는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 127만 평(약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36만 평(119만㎡)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복합단지 내 테마파크는 파라마운트 IP를 담은 놀이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쇼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체 MD(기획 상품), F&B(식음료) 등을 스타 베이 시티에 특화된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신세계화성 관계자는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3,000만 명이 스타 베이 시티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그룹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 비전 총괄 부사장은 올해 1월 인천광역시와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상 장소인 드림파크 승마장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조성해 사용한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공사)가 여러 차례 운영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불발되면서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부지였다. 주 경기장, 연습경기장, 대회 본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와 비슷한 17만㎡의 전체 면적을 자랑한다.
한화는 이곳에 2,500억 원을 투입해 승마장과 아쿠아리움, 놀이기구 등을 갖춘 돔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쿠아리움은 약 6만 6,115㎡ 규모로 건립, 인천 대표 해양 생물을 확보하는 등 지역 특색을 담을 것으로 예고됐다.

이처럼 유통 기업들이 앞다투어 테마파크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대형 테마파크는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 경제와 운영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고객 경험을 통한 소비 극대화를 끌어낼 수 있어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보장된다.
특히 기업적 측면에서 테마파크는 유통, 관광, 호텔, 콘텐츠 등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꾀할 수 있다. 이들에게 테마파크가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일례로 일본 오사카의 코노하나구를 들 수 있다. 코노하나구는 1960년대 일본의 산업 성장을 주도한 한신임해산업지대의 중심지였지만,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다 2001년 3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개장하며 부활했다. 일본의 다이와은행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국적으로 8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 세계 테마파크 시장이 성장세인 데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테마파크의 불모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테마파크 시장 규모는 2024년 559억 달러에서 2032년 1,24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세계 테마 엔터테인먼트협회(TEA)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25위 테마파크 입장객 순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에버랜드의 연 입장객은 588만 명, 롯데월드는 519만 명으로 각각 세계 19위, 23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이 디즈니랜드 등의 테마파크로 엄청난 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실제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는 1,510만 명으로 4위,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1,400만 명으로 5위에 오르며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훨씬 상회했다.
실제 신세계와 화성시는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3,000만 명이 방문하는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고용·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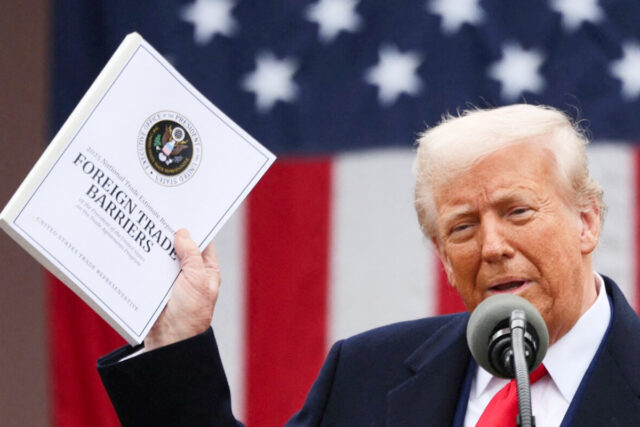













댓글0